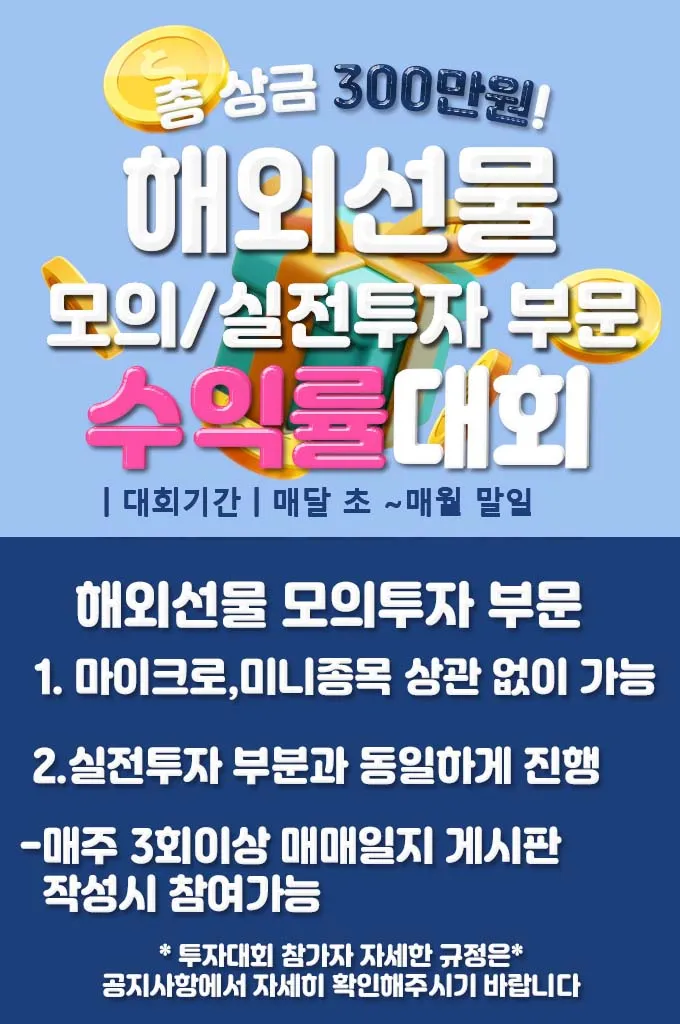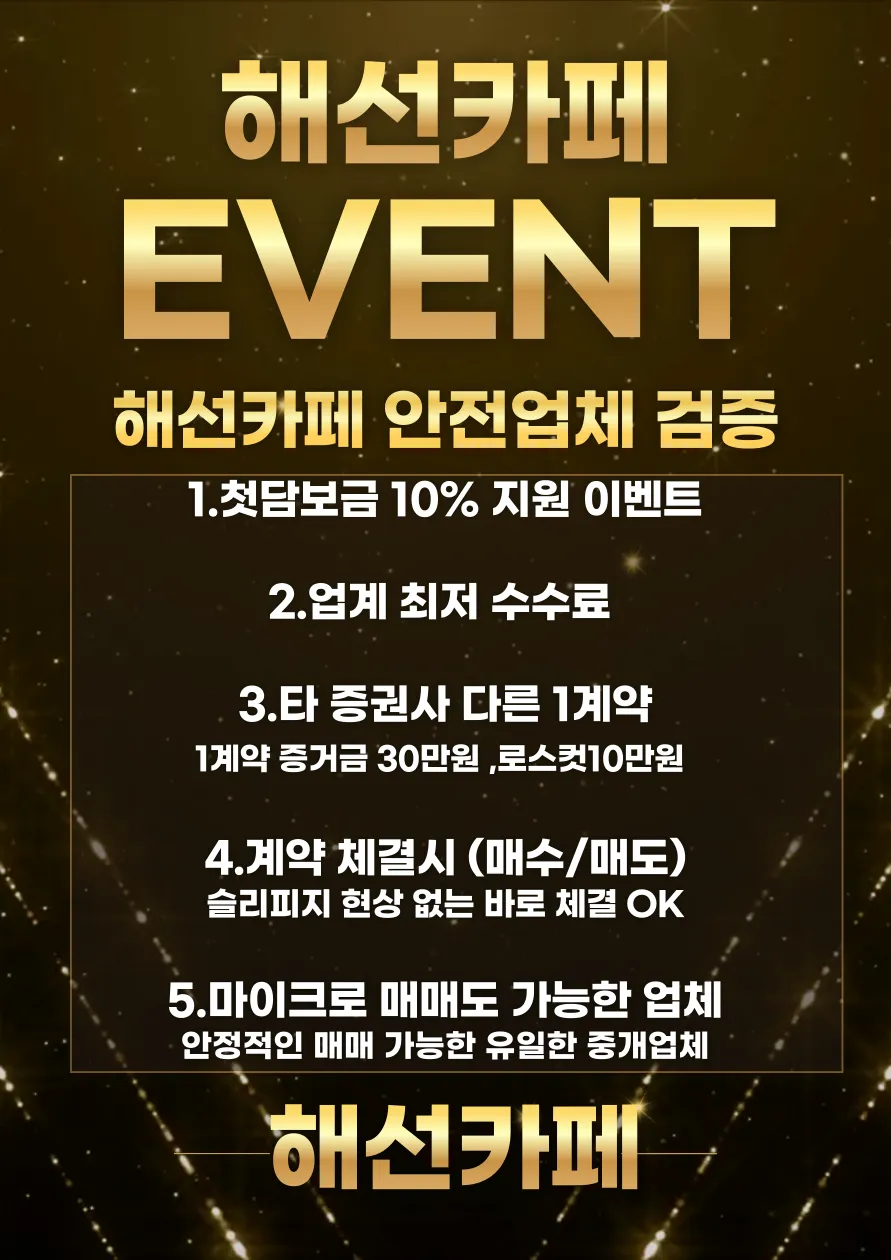"美 관세정책, K-배터리엔 기회…북미 ESS 배터리 생산해야"
오익환 SNE리서치 부사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8회 차세대 배터리 콘퍼런스(NGBS 2025)'에서 "대중국 관세로 미국 ESS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배터리의 공급이 막히면, 이는 한국 업체들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북미 ESS 배터리 수요는 78GWh(기가와트시)로 이 가운데 약 87%(68GWh)가 중국산 배터리였다. 현재 중국 CATL, BYD, EVE 등이 저가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워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다.
ESS는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로, 북미 ESS 배터리 시장은 올해 97GWh에서 오는 2030년에는 179GWh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발 관세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됨에 따라 한국 배터리 업체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 셀에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 중국 배터리 업체의 기존 고객의 수요가 줄고, 이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채울 수 있다는 게 오 부사장의 분석이다.
또 한국 업체들이 북미 생산 시 관세를 회피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중국 상호관세를 34%에서 84%(총 104%)로 올렸으며 이날 다시 21%포인트를 높인 상태다.
오 부사장은 "북미 ESS 수요는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중국 업체가 빠지면) ESS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한국뿐"이라며 "미국 관세 정책으로 중국산 배터리는 계속 가격이 오르게 되고, 한국 업체가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면 AMPC를 받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에 라인을 개조하든 공장을 짓든 해야 하고, 전 세계 ESS 시장에서 고착화된 '각형 LFP'를 해야 한다"며 "(한국의) 양극재 업체들도 배터리 업체들의 생산 계획에 맞춰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미국 미시간주에 위치한 제너럴모터스(GM)와의 3번째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 3기 인수를 공식화하고, 미시간 홀랜드 공장과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의 ESS 제품 생산을 발표했다.
다만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과 북미 시장의 위축 리스크는 남아있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진입해 생산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부사장은 "IRA 보조금 축소나 중국산 원재료의 높은 의존도, 코스트(비용) 상승으로 인한 시장 위축은 위기 요인일 수 있다"며 "2025∼2026년 내 북미 생산과 소재 내재화가 성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